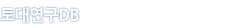 |
|
|
강대진

|
|
| 영화인명 |
|
강대진 |
|
| 권역명 |
|
한국권(북한포함) |
|
| 직능(직업) |
|
영화감독 |
|
| 국적 |
|
대한민국 |
|
| 작품 목록 |
|
<부전자전>(Like father, like son (Bujeonjajeon), 한국,1959)
<박서방> (Mr. Park (Bakseobang), 한국, 1960)
<해떨어지기 전에> (Before sun(Haetteol-eojigi jeon-e), 한국, 1960)
<마부> (A Coachman (Mabu), 한국, 1961)
<어부들> (Fishermen (Eobudeul), 한국, 1961)
<상한 갈대를 꺾지마라> (Don’t Break Damaged Reeds (Sang-han Galdaereul Kkeokjimara), 한국, 1962)
<외나무다리> (A Log Bridge (Oenamudari), 한국, 1962)
<사랑과 미움의 세월> (Times of Love and Hatred (Sarang-gwa Mi-um-ui Sewol), 한국, 1962)
<새엄마> (The Stepmother (Sae-eomma), 한국, 1963)
<옛날의 금잔디> (Golden Grass of Yesterday (Yennare Geumjandi), 한국, 1963)
<울며 헤어진 부산항> (To Part at Busan Harbor in Tears (Ulmyeo He-eojin Busanhang), 한국, 1963)
<사랑이 메아리치면> (When Love Makes an Echo (Sarangi Mearichimyeon), 한국, 1964)
<딸의 훈장> (The Daughter’s Medal (Ttal-ui Hunjang), 한국, 1964)
<이쁜이> (The Beautiful Maid (Ippeuni), 한국, 1964)
<목숨보다 더한 것> (What Is More Valuable than Life (Moksumboda Deohan Geot ), 한국, 1964)
<단골손님> (The Regular Customers (Dangol Sonnim), 한국, 1964)
<삭발의 모정> (Haircutting Motherly Love (Sakbal-ui Mojeong), 한국, 1965)
<슬픔이여 잘 있거라> (Farewell, Sorrow (Seulpeumiyeo Jal Itgeora), 한국, 1965)
<청춘극장> (Sorrowful Youth (Cheongchun Geukjang), 한국, 1967)
<보은의 기적> (A Miracle of Gratitude (Bo-eunui Gijeok), 한국, 1967)
<무번지> (Mubeonji (Mubeonji), 한국, 1967)
<가고파> (I Want to Go (Gagopa), 한국, 1967)
<고향> (Hometown (Gohyang), 한국, 1967)
<강명화> (Gang Myeong-hwa (Gang Myeong-hwa), 한국, 1967)
<옥비녀> (Jade Pin (Ok Binyeo), 한국, 1968)
<가로수의 합창> (Chorus of Trees (Galosu-ui Hapchang), 한국, 1968)
<소라의 꿈> (Dreams of Sora (Soraui Ggum), 한국, 1968)
<사랑> (Love (Sarang), 한국, 1968)
<낙엽> (Fallen Leaves (Nagyeop), 한국, 1968)
<흐느끼는 백조> (Sobbing Swan (Heuneukkineun Baekjo), 한국, 1968)
<자유부인> (Madam Freedom (Jayu Buin), 한국, 1969)
<겨울부인> (Winter Woman (Gyeoul Buin), 한국, 1969)
<재생> (Rebirth (Jaesaeng), 한국, 1969)
<눈물젖은 부산항> (Tearful Separation at Busan Harbor (Nunmuljeoj-eun Busanhang), 한국, 1970)
<당신이 미워질때> (When We Have Hatred (Dangsin-i mi-wojilttae), 한국, 1970)
<버림받은 여자> (An Abandoned Woman (Beolimbad-eun yeoja), 한국, 1970)
<당신은 여자> (Thy Name is Woman (Dangsin-eun yeoja), 한국, 1970)
<돌아갈 수 없는 고향> (My home where I can never go back (Dol-agal su eobsneun gohyang), 한국, 1972)
<웃고 사는 박서방> (Ever smiling Mr. Park (Usgo saneun Bakseobang), 한국, 1972, 각본)
<달래> (Dalrae(Dallae), 한국, 1974)
<망나니>(An executioner (Mangnani), 한국, 1974, 제작)
<유정> (Feelings (Yujeong), 한국, 1976)
<사랑의 원자탄> ( The Atom Bomb of Love (Salang-ui wonjatan), 한국, 1977)
<사랑의 뿌리> (The Root of Love (Salang-ui ppuli), 한국, 1978)
<옛날옛적에 훠어이훠이>(Once Upon A Long Time Ago (Yesnal yesjeog-e hwo-eo-i hwo-i), 한국, 1978, 제작)
<석양의 10번가(빛을 마셔라)> (The Sunon 10th Avenue (Seog-yang-ui 10beonga), 한국, 1979)
<죽으면 살리라> (Die To Live (Jug-eumyeon sallila), 한국, 1982)
<화평의 길> (Road to Peace (Hwapyeong-ui gil), 한국, 1984)
<몽마르트 언덕의 상투> (A Top Knot on Montmartre (Mongmareuteu eondeok-ui sangtu), 한국, 1987) |
|
| 소개 |
|
강대진 Kang Dae-jin 姜大振 (1933~1987)
한국의 영화감독. 강대진은 1933년 전남 목포 출생이다. 강대진은 초등학교 때 최인규 감독의 <파시>(1949)를 보고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서라벌 예술대학(중앙대의 전신)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신상옥 감독 밑에서 조감독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강대진의 데뷔작은 1959년 발표한 <부전자전>(1959)이었다. 이 영화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다양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일상을 정감있게 그린 코미디물이었다. 이후 그는 서민들의 일상이 엿보이는 고진감래를 주제로 한 영화를 지속적으로 연출하였다. <박서방>(1960), <해떨어지기 전에>(1960), 그리고 그의 역작인 <마부>(1961)도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영화였다.
이 시기는 전쟁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유흥을 즐기려는 관객들이 늘어나면서 영화산업은 날로 발전하였다. 이야기 위주의 통속적인 멜로드라마가 유행하던 당시에 강대진의 영화는 섬세함을 가미한 사실주의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대중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강대진의 영화는 소박한 사실주의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더욱이 현실적인 문제(근대화된 사회상)와 사회현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어 관객들은 그의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첫 영화 이후 이듬해 발표한 <박서방> (1960), <해떨어지기 전에> (1960)와 <마부> (1961), <어부들> (1961)도 우리네와 닮은 서민들이 주인공이다. <박서방>(1960)은 10만 명의 관객몰이를 하면서, 평범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 각광을 받았다. <박서방>(1960)은 제4회 부일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 제8회 아세아영화제에서 최우수남우주연상과 신인특별연기상, 공보부에서 지정한 우수국산영화상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마부>(1961)는 마부 일을 하고 있는 춘삼과 고시공부를 하는 기대주인 큰 아들과 희망 없는 작은 아들과 두 딸들의 가족이야기이다. 평론가 이효인은 “판검사는 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신분상승과 함께 밑바닥 인생까지도 비약의 가능성을 준다. 마부 아들의 고시합격은 편입되기 힘든 근대의 질서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보증서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대인들의 욕망과 근대화된 사회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마부>(1961)는 '마부'라는 직업상의 특성을 내세워 당시 교통수단의 변화와 서울의 공간묘사 등으로 전근대와 근대가 혼재하는 사회상을 펼쳐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고통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재확립시킨다는 주제를 내세운 영화였다. 또 이 영화는 베를린영화제 특별은곰상을 받아 한국영화로서는 해외 영화제 첫 수상작으로 기록되어있고, 15만 관객동원으로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이었다.
이처럼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박서방>(1960), <해떨어지기 전에>(1960), <마부>(1961), <어부들>(1961)은 강대진의 대표작으로 손 곱힌다. 이후 그는 가족드라마 이외 멜로드라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사랑과 미움의 세월>(1962)은 물론, 〈상한 갈대를 꺾지 마라>(1962), 〈외나무 다리>(1962), 〈새엄마>(1963),〈청춘극장>(1967) 등과 같은 작품들이 있다. 더욱이 1960년대 강대진은 매 해마다 다수의 영화를 연출하면서 다작 감독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1967년 <청춘극장>(1967)은 1959년 홍성기에 의해 한 차례 영화화되었던 작품으로 1952년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김내성의 장편소설 ‘청춘극장’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강대진의 <청춘극장>(1967)은 주인공들의 복잡한 애정문제와 젊은 청년들의 애국운동을 미화시킴으로써 계층을 망라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동아일보』, 1966.6.25) 여주인공 ‘오유경’역을 공개 모집할 당시 1,200:1의 경쟁률을 뚫고 신인배우 오디션에 합격했던 윤정희가 이 작품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그리고 운옥역을 맡은 여배우 고은아는 <청춘극장>(1967)의 제작자인 곽정환과 결혼을 하였다. <청춘극장>(1967)은 당시로서 30만에 가까운 관객동원을 하면서 흥행돌풍을 일으켰다.
서민영화와 멜로드라마로 큰 인기를 누였던 강대진은 1970년대 말 종교영화에 심취해 여러 작품들을 남겼다. <사랑의 원자탄>(1977), <사랑의 뿌리>(1978), <석양의 10번가>(빛을 마셔라)>(1979), <죽으면 살리라>(1982), <화평의 길>(1984) 등을 연출하였다. <사랑의 뿌리>(1978)는 종교성이 짙은 영화로 작품성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종교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작품은 제17회 대종상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강대진은 1987년 정동환· 안소영 주연의 <몽마르트 언덕의 상투>(1987)를 끝으로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강대진은 한국영화에서 거의 무시되어온 '생활'이나 '현실'의 단편을 영화화하였고, 대중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내었다. 강대진은 서민중심의 영화와 그러한 사람들이 엮어가는 멜로드라마를 줄곧 연출하였다. 강대진의 영화에는 당대의 감독들이 선호했던 액션영화는 한 편도 들어있지 않다. 그만큼 특수계층과 대중오락적인 삶보다 보통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을 두었고, 그러한 삶이 강대진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