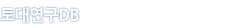 |
|
|
철원군 귀농선(歸農線) 북방농지 경작권을 둘러싼 갈등

|
|
| 갈등개요 |
|
1) 갈등 개요와 원인 1954년 2월 미8군당국에 의해 확정된 귀농선(歸農線)은 군의 작전상 민간인, 특히 농민들의 출입을 제한시킨 선이다. 남방한계선과 대체로 10리 내지 15리 가량 떨어져 있다. 이 안에서 농부들은 출입증을 소지해야 하고,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들어가 논밭 일을 보게 되어 있었다. 귀농선에서 경작한계선까지의 경작면적은 4,325정보로 이 전답을 경작하는 농민은 12,065명이었다. 이들 귀농민 중 432명만 입주영농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가유숙(假留宿) 혹은 출입증을 갖고 매일 출입영농을 하고 있었다.
미8군은 1962년 3월 경작한계선을 확정하였는데, 1963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귀농선의 북상을 지시하게 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귀농선이 북상되자 군의 보안유지와 국내 식량증산목적이 상충하게 되었다. 귀농선의 북상은 식량의 증산을 가져오는 한편, 무장지대의 보안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면서 군과 농민이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군 당국은 유사시에 민간인 철수문제와 작전상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경작한계선을 주저항선(主抵抗線) 이남으로 끌어내리고자 했고, 귀농민들은 해마다 작전지역으로 침식해 들어가 주저항선을 훨씬 넘게 되었다. 1963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300m지점에 이르는 위험한 곳까지 근접해 농사를 짓게 되었다. 이들이 농사를 짓는 농토는 주저항선에서 최고 8㎞가량 북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1㎞가량을 더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귀농인들은 새로 입주해온 13,000여 농민들이 경작할 1,000여 정보의 개간허가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군당국은 이것을 무시하였고, 반면 연고도 없는 특정군인이나 그의 가족에게는 개간허가를 내주면서 군과 농민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964년 11월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 영농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성안하여 각의(閣議)에 제출함으로써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농민들은 귀농선에 있는 원주민들이 소수이고, 수복지구는 지적도와 등기부도 없는 것이 보통이며, 경작에 뒤따르는 공납금도 없기 때문에 앞 다투어 전선지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철원군에 주둔한 군당국은 그동안 10년 동안 묵혀두었던 기름진 농토를 현지농민들이 개간경작을 하겠다는 요구에 당황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인이나 그의 가족 등 이른바 「혁명주체세력」이라는 특수층에게 개간허가를 해주고 있었다. 농민들은 이러한 군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동호개척단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군당국은 개척단이 개간하고 있는 땅은 농민들이 ‘개간불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버린 것을 트랙터 10대와 소 5마리 등의 개간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척단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
|
| 진행경과 |
|
군 당국은 유사시에 민간인 철수문제와 작전상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1962년 3월에 미8군이 정식승인한 경작한계선을 주저항선 이남으로 끌어내리려 하였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적어도 경계진지 이남으로라도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1964년 2월 새로 입주해온 13,000여 농민들은 경작할 1,000여 정보의 개간허가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군당국은 이를 무시하였다. 농민들의 분노는 3월 26일 연고도 없는 혁명주체 82명으로 구성된 「동호개척단」이 이곳에 입주하자 절정에 달하였다. 원경작농민들은 4월 15일 1차로 궐기대회를 열고, 군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개척단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원경작자 3,000여명은 5월 5일 동송면 광장에서 2차 「귀농선 북방농경지 독점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법허가한 군수는 물러가라’, ‘귀농선 북방농지는 동호농장이나 어느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농민들은 탄원서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요로에 보내기로 하였다. 동호개척단에게 농지를 빼앗긴 철원지구 귀농선북방 출입경작농민들의 울분은 5월 10일 3차 궐기대회에서 그들의 생명선인 농토를 반환해 달라는 절규로 분출되었다. 이들은 동호농장의 철수, 군 본연의 임무를 잊은 일부군인의 인책과 엄단, 농경지를 박탈한 일부군인의 경작권 이양, 영농행정을 군대에서 지방행정관서로 넘길 것, 군인과 결탁하여 소작행위를 하는 자의 처단, 황금보의 개방 등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1964년 11월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 영농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성안해 각의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에 따라 귀농선 북방의 영농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1967년 2월 17일 전방지역의 민간인통제선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과의 사이에 있는 지역일대에 이스라엘 방식을 본뜬 「전략촌」을 세울 방침을 밝혔다. 1968년 완성을 목표로 한 이 전략촌은 통제선 이남에 거주하면서 작전구역 안으로 출입영농을 하고 있는 약 55,000가구와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거주하면서 영농중인 약 45,000가구를 합쳐 지역별로 구성할 예정이었다. 전략촌 편성계획에는 당시 출입영농 중이던 55,000가구에게는 민간인통제선이 사실상 북상하는 한편, 민간인통제선 이북 작전지역에 흩어져 영농 중이던 45,000가구를 집단화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진행경과 | | | 1954. 2. 1955. 1963. 3. 26. 1963. 3. 1964. 2. 1964. 3. 26. 1964. 4. 15. 1964. 5. 5. 1964. 5. 10. 1964. 11. 5. 1967. 2. 14. | 미8군 당국, 귀농선 확정 농민, 철원지구 귀농선북방 출입개척 경작 미8군, 경작한계선 확정 박정희대통령, 귀농선 북상 지시(식량증산 목적) 신규 입주농민들(13,000여명), 1,000여정보의 경작지 개간허가요구서 제출. 무시당함 혁명주체 제대군인 82명, 「동호개척단으로」 입주. 개간허가 획득 원경작자, 1차 궐기대회 원경작자, 2차 궐기대회: 3,000여명, 동송면광장 데모 「귀농선 북방농경지 독점반대 궐기대회」 원경작자, 3차 궐기대회: 2,000여명, 농토 반환 절규 국방부,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 영농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성안, 각의 제출 국방부, 「전략촌」 건립계획 : 민간인통제선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사이 | |
|
| 발생기간 |
|
1963-03-01 ~ 1964-11-01 |
|
| 주체 |
|
정부-민간 |
|
| 이해당사자 |
|
강원도 철원군, 국방부, 귀농민 |
|
| 지역 |
|
강원
|
|
| 행정기능 |
|
농림해양수산 |
|
| 성격 |
|
이익갈등 |
|
| 해결여부 |
|
해결 |
|
| 정권 |
|
박정희
|
|
| 주요용어 |
|
귀농선, 비무장지대, 동호개척단,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 영농에 관한 임시 특례법 |
|
| 참고문헌 |
|
경향신문 1961. 6. 28. 3면 동아일보 1964. 5. 6. 7면 경향신문 1964. 5. 11. 7면 동아일보 1964. 5. 11. 7면 경향신문 1964. 5. 19. 7면 동아일보 1964. 5. 19. 3면 동아일보 1964. 6. 18. 3면 동아일보 1964. 11. 5. 7면 동아일보 1967. 2. 14. 7면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