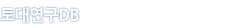 |
|
|
영산강 유역 치수공약 피해 갈등

|
|
| 갈등개요 |
|
1) 갈등 개요와 원인
영산강유역은 전남최대 곡창지대로, 쌀과 보리 등의 생산고(生産高)가 연간 220만섬에 달하는 농사에 우수한 풍토였다. 하지만 지대가 낮고 비가 많은 상습수해지역으로 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과 생활터전으로의 기반이 매우 부실한 곳이었다. 1963년에는 큰 홍수로 30억원의 피해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1974년 8월 다시 물난리를 겪게 되자 갈등이 발생하였다.
상습수해지역인 영산강유역은 1966년부터 정치인들이 예산과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선심성ㆍ무책임 공약을 남발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증폭된 경우이다. 건설부가 1971년 영산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972년 봄에 착공을 하기까지 정치인들의 치수공약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더욱이 1972년 봄 착공 후에도 수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건설부는 1971년부터 10개년 동안 1,971억원을 들여 댐건설, 하천개수, 사방사업 등을 통해 피해를 연간 60%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974년 3월을 기준으로 각 사업의 공정은 10%밖에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여전하였다. 또한 1981년까지 홍수조절량 1,500만톤 규모의 동복다목적댐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댐 지점의 홍수량을 50%밖에 조절치 못해 주민들의 숙원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든 실정이었다.
영산강의 원류는 전북 정읍지방의 입암산 등 전남북의 5대 산골짜기의 물로 이루어지는데, 나주군 영산포읍에서 황룡강과 합류된다. 장성, 담양 등 상류지방에서 100mm의 비만 내려도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나주군 일대는 물에 잠기기 일쑤였고, 영산포읍은 물에 잠기게 된다. 또한 영산강유역은 태풍의 진로이기도 한 곳인데, 저지대가 계속돼 유속이 느리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강폭은 좁아지는 지형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강구인 무안군 동강면 앞바다에서 바닷물까지 밀려 들어와 강물은 저지대를 엄습하여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정부의 1971년 영산강 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1972년 치수관리가 착공되었으나, 10개년이라는 장기 공사기간으로 주민들은 수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74년 8월 전남북의 수해를 계기로 영산강 유역 개발계획을 앞당겨 1975년까지 담양 등 4개댐 건설을 끝내기로 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1976년 4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 제1단계 공사인 장성, 담양, 광주, 대초댐 건설공사가 모두 완공단계에 들어감으로써 갈등은 부분적으로 해결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갈등의 쟁점은 선거철만 되면 입후보자들이 영산강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호언장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수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집권당은 영산강 개발을 약속하면서 측량기자재를 가진 사람들이 형식적인 치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치수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줄어들었고, 결국엔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영산포읍 영강초등학교는 1968년 개교 이래로 4번이나 학교가 완전히 침수되어 주민들이 교육을 포기할 정도였다. 또한 나주읍 토계리에서는 30년 전에 만든 수문 1개 뿐인 제방으로 버티는 실정이었으며, 큰 비로 가족을 잃게 되는 사태도 빈발하였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였다.
|
|
| 진행경과 |
|
해마다 겪는 수해에 지친 주민들은 1974년 9월 2일 영산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정부가 착공일을 앞당겨 줄 것을 호소하였다. 정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해도 완공까지 10년간 수마를 견뎌낸다는 것은 거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1974년 8월 전남북의 수해를 계기로 영산강 유역 개발계획을 앞당겨 1975년까지 담양댐 등 4개댐 건설을 끝내기로 하였다. 1976년 4월 1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 제1단계 공사인 장성, 담양, 광주, 대초댐 건설공사가 모두 완공단계에 들어가 마무리작업인 가운데, 4개댐의 수몰민 1,672가구 중 72%인 1,205가구 이주를 끝냈지만 나머지 467가구가 오갈 데가 없어 영세이주민 문제가 남은 채 갈등은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다.
| 진행경과 | | | 1966.~1971. 1971. 2. 18. 1972. 3. 1. 1973. 3. 1974. 8. 30. 1974. 9. 2. 1974. 9. 14. 1976. 4. 12. | 정치인들의 예산과 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는 치수공약 남발 정부, 10개년 영산강종합개발계획 발표 영산강 종합개발계획 착공 사업공정 10% 진행, 피해 여전 영산강 유역 큰 홍수 영산강 유역 주민, 계획기간 앞당겨 건설해 줄 것을 호소 농업진흥공사, 영산강 유역 공사 앞당겨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영산강유역 종합개발사업 제1단계 공사인 장성, 담양, 광주, 대초댐 건설공사 완공 | |
|
| 발생기간 |
|
1974-01-01 ~ 1976-12-01 |
|
| 주체 |
|
정부-민간 |
|
| 이해당사자 |
|
영산강 유역 일대 자치단체, 해당지역주민 |
|
| 지역 |
|
전북 전남
전남 광주
광주
|
|
| 행정기능 |
|
지역개발 |
|
| 성격 |
|
이익갈등 |
|
| 해결여부 |
|
해결 |
|
| 정권 |
|
박정희
|
|
| 주요용어 |
|
영산강 유역, 상습수해지역, 영산강종합개발계획 |
|
| 참고문헌 |
|
동아일보 1966. 4. 13. 1면 매일경제 1971. 2. 18. 1면 동아일보 1974. 9. 2. 7면 경향신문 1974. 9. 3. 5면 매일경제 1974. 9. 5. 1면 동아일보 1976. 4. 12. 7면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