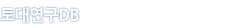 |
|
|
무령왕릉 유물이송 반대 갈등

|
|
| 갈등개요 |
|
1) 갈등 개요와 원인
무령왕릉은 충남 공주시 금성동(옛 이름은 송산리)에 위치해 있으며, 1971년 6월 송산리 5호분·6호분의 배수구를 마련하는 작업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고분의 축조연대와 피장자(被葬者)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도굴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왕릉의 유물은 모두 국보급으로 공주군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문화공보부의 지시로 공주박물관장이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유물 일부를 서울로 이송하여 주요 인사들에게 보여주고, 그날 밤에 공주박물관으로 되돌아 온 사건이 알려졌다. 이날 공주군의 유지들이 공주문화원에 모여 백제문화보호촉진회를 결성하고, 서울 반출을 반대한다고 결의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공주에서 출토된 국보급문화제가 서울로 반출된다는 소문이 나오자 무령왕릉발굴현장을 구경하러온 읍민들을 중심으로 서울이송반대시위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3일 문공부가 유물을 서울로 이전할 계획을 공주박물관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주읍민 9만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중 일부는 철야시위를 벌이고, 공주박물관의 경비를 서기도 하였다. 공주읍민의 서울이송반대시위가 일자 7월 14일에 문화재관리국장과 박물관장이 공주로 내려와 반대주민대표들과 협의를 가졌으나 결렬되었다. 그러자 문공부장관과 충청남도를 순시하는 국무총리까지 학술조사 및 공주박물관 신축을 약속하였고, 7월 15일 정부대표와 주민대표들 간의 2차 협의에서 금관등 한 쌍씩만 서울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하고, 반드시 반환한다는 약속을 받으면서 이송에 합의해 갈등이 완화되었다. 이 사례는 문화재관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무령왕릉은 공주지역 관광자원 확보와 자존감 고취를 중요한 자원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가치를 가졌으나, 서울로 이송되는 허탈감에서 비롯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송반대투쟁위원회는 공주에서 발견된 유물은 공주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부장품 이송을 결사반대하며, 유물조사본부를 공주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화재관리국과 국립박물관측은 ① 공주박물관은 목조건물이며 낡고,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온도조절이 곤란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② 학술적인 연구 분석 후 반환할 것과, ③ 유물은 공주군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상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④ 일괄조사 후 공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
| 진행경과 |
|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5일 송산리 5호 석실분과 6호 전축분의 무덤 내부에 스며드는 습기를 막기 위한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공사를 위해 6호분 봉토 북측을 제토(除土)하는 과정에서 왕릉의 연도부가 노출된 것이었다. 7월 7일 무덤의 아치형 입구를 발견하였고, 다음날인 8일에는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어 7월 9일에 발굴이 완료되었다. 이날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8종 2,906점으로 국보급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무령왕릉 발굴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 들어 공주 읍내는 온통 축제열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7월 10일 공주박물관장이 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금관, 금팔찌, 금제머리꽂이 등 20점을 고속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가져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이 날 오후 몇몇 유지들은 공주문화원에서 백제문화보호촉진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공주에서 발굴된 유물은 공주에 있어야 한다며 공주군수에 항의하였다. 그날 밤에 서울에서 공주박물관장이 유물을 갖고 돌아오자 지역유지들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왕릉유물이 서울로 이송된다는 소문이 나오자 읍민 3,000여명은 공주박물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무령왕릉부장품 이송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유물조사 본부를 공주에 두라”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반대집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문공부와 국립박물관은 7월 13일 문화재 항구보존 처리 및 학술적 검사 진행 등에 협소한 공주박물관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공주박물관에 이송계획을 지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송반대투쟁위원회가 가두방송을 시작하자 순식간에 2,000여명의 군민들이 모여 ‘유물이송결사반대’등 현수막을 펼치고 연좌농성을 하였다. 공주북중학교 500여명의 학생들도 ‘군민은 궐기하자’, ‘국보는 공주에 두라’등 현수막을 펼치고 읍내를 가두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밤에 반출할지 모른다며, 철야농성하며 경비를 자처하기도 하였다.
7월 14일 오전에는 ‘무령왕릉부장품 이송반대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주읍백제문화개발촉진대회’를 열고 이송반대를 결의하는 등 서울이송에 대한 공주군민의 반대의지가 대단하였다. 이에 정부는 문화재관리국장과 국립박물관장을 공주에 파견하여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주민대표측은 부장품이송 결사반대 및 유물조사본부 공주설치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민대표들은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무령왕릉의 성역화 작업을 조기 집행하고, 충청남도는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공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충청남도를 방문한 국무총리까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학술적 연구 분석과 보존처리만 하고 반환할 것이며, 15,000만원을 들여 공주박물관 신축하고 국립박물관에 보관된 모든 백제유물을 공주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하였다. 다음날 15일 문화재관리국장과 국립박물관장 그리고 백제문화제개발촉진회 대표들과 모여 서울 이송 2차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협의에서 왕관, 왕비관, 지석 1짝씩과 금팔찌, 금귀걸이 각 1개씩을 공주박물관에 남겨놓기로 하면서 이송이 합의되었다. 7월 16일 새벽 20여점의 금제품과 목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국립박물관으로 이송하였다. 공주박물관에 남아 있는 유물은 서울에 이송된 유물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교체해가며 조사처리 하도록 한 것이었다.
| 진행경과 |
| | 1971. 6. 29.
7. 7.
7. 9.
7. 10.
7. 12.
7. 13.
7. 14.
7. 15.
7. 16.
10. 12. | 배수로 공사중 무령왕릉 전돌 발견. 무덤 아치형 입구 발견 발굴 완료 공주박물관장, 귀금속제 유물 고속버스로 서울 이송 및 반송 백제문화보호촉진회 결성(공주문화원) : 공주반출 반대 결의 서울이송반대 공주읍민 농성 시위(공주박물관 앞) 문공부, 공주박물관에 유물 서울이송 지시. 공주읍민(9만명), 공주박물관 앞 철야 농성 공주읍백제문화개발촉진회 개최, 이송반대 결의(무령왕릉부장품 이송반대투쟁위원회 결성) 문화재관리국장, 중앙박물관장, 주민대표 협의 및 결렬(문공부장관과 국무총리, 학술검사 후 반환 및 공주박물관 신축 약속) 문화재관리국, 중앙박물관장, 주민대표 협의 - 이송 합의 서울이송 공주박물관 신축개관 (무령왕릉 유물 전시) | |
|
| 발생기간 |
|
1971-07-01 ~ 1971-10-01 |
|
| 주체 |
|
정부-민간 |
|
| 이해당사자 |
|
문공부(문화재관리국), 국립박물관,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군민(대책위) |
|
| 지역 |
|
충남
|
|
| 행정기능 |
|
문화체육관광 |
|
| 성격 |
|
가치갈등 |
|
| 해결여부 |
|
해결 |
|
| 정권 |
|
박정희
|
|
| 주요용어 |
|
무령왕릉, 백제문화, 공주박물관, 무령왕릉부장품 이송반대투쟁위원회 |
|
| 참고문헌 |
|
매일경제신문 1971. 7. 14. 1면 경향신문 1971. 7. 14. 7면 동아일보 1971. 7. 14. 7면 중앙일보 1971. 7. 14. 조선일보 1971. 7. 14. 7면 조선일보 1971. 7. 15. 6면 조선일보 1971. 7. 15. 7면 중앙일보 2002. 12. 12. |
|
|
|
|
|
|
|
|